북리더스 고객사에서 이용하고 계신 도서리스트 입니다.
- 전체
- 문학
- aaa
- aaa
- aaa
- 일본소설
- 한국소설
- 영미소설
- 중국소설
- 기타언어소설
- 한국에세이
- 외국에세이
- 시
- 기타(평론/비평 등)
- 경제/경영 77
- 경제 17
- 경영 32
- 마케팅/세일즈 10
- 투자/재테크 11
- 기타(경제/경영) 7
- CEO/비즈니스맨
- 자기계발 105
- 성공/처세 70
- 능력계발 15
- 기타(자기계발) 20
- 인간관계
- 인문/역사/사회 101
- 인문 34
- 역사 26
- 인물 1
- 사회과학/정치 29
- 자연/과학 10
- 기타(인문/역사/인물) 1
- 기타 39
- 언어 1
- 가정/생활/요리 3
- 컴퓨터/인터넷 3
- 건강/취미/실용 5
- 만화
- 여행
- 예술/대중문화
- 정기간행물
- CD/DVD
- 육아/자녀교육 9
- 유아/아동/어린이 1
- 기타(기타) 17
- isbn
- 9788956250595
- 저자
- 김훈 저
- 출판사
- 학고재
- 출판일
- 2007-04-14
- 정가
- 11,000
- 책소개
-
백성의 초가지붕을 벗기고 군병들의 깔개를 빼앗아 주린 말을 먹이고, 배불리 먹은 말들이 다시 주려서 굶어 죽고, 굶어 죽은 말을 삶아서 군병을 먹이고, 깔개를 빼앗긴 군병들이 성첩에서 얼어 죽는 순환의 고리가 김류의 마음에 떠올랐다. 버티는 힘이 다하는 날에 버티는 고통은 끝날 것이고, 버티는 고통이 끝나는 날에는 버티어야 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었는데, 버티어야 할 것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버티어야 하는 것인지 김류는 생각했다. 생각은 전개되지 않았다. 그날, 안에서 열든 밖에서 열든 성문은 열리고 삶의 자리는 오직 성 밖에 있을 것이었는데, 안에서 문열 열고 나가는 고통과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통의 차이가 김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김류는 느꼈다.--- p.93
서날쇠는 새벽에 떠났다. 김상헌이 떠나는 서날쇠를 성벽까지 따라갔다. 동쪽 성벽은 옹성을 지나서 오르막으로 치달았고, 그 아래에 배수구가 뚫려 있었다. 서날쇠는 배수구를 향해 산길을 걸었다. 지팡이가 눈 속으로 빠져서 김상헌은 자주 비틀거렸다. 서날쇠가 김상헌을 부축했다.
- 대감, 여기서부터는 더 가팔라집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 아니다. 떠나는 걸 보고 싶다.
서날쇠의 행장은 가벼웠다. 초로 봉항 격서를 기름종이에 싸서 저고리 속에 동였다. 등에 진 바랑 하나가 전부였다. 바랑 안에는 가죽신 세 켤레와 버선 한 죽, 호미 한 개,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서날쇠는 먹을 것을 지니지 않았다. 김상헌은 서날쇠의 바랑 속이 궁금했다.
- 끼니거리는 지녔느냐?
- 먼 길을 가니, 한두 끼를 지녀서 될 일이 아니옵고......
- 어찌하려느냐?
- 백성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빈 밭을 파면 뿌럭지들이 나옵니다.
김상헌의 목젖이 뜨거워졌다. ...날쇠야, 너는 갈 수 있고, 너는 돌아올 수 있다......--- p.231
적이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종묘와 사직단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도성이 포위되면 서울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일은 아예 없을 터였다. 파주를 막아 낼 수 있다면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을 버려야 할 일이 없을 터이지만,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을 수 없는 까닭은 적들이 이미 임진강을 건넜기 때문이었다. 반드시 죽을 무기를 쥔 군사들은 반드시 죽을 싸움에 나아가 적의 말발굽 아래서 죽고, 신하는 임금의 몸을 막아서서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서서 아비는 아들을 죽인 적을 베고, 아들은 누이를 간음한 적을 찢어서 마침내 사직을 회복하리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 pp.18~19
눈 덮인 성벽에 햇빛이 내려서 성은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북쪽 능선을 넘어가는 성벽 위에 낮달이 떠 있었다. 간밤에 작은 교전이 있었는지 성벽에 돋아난 나뭇가지에 찢어진 시체가 몇 구 걸렸고, 시체 언저리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용골대가 통역 정명수에게 말했다.
-단단해 보인다. 산골나라에...적이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종묘와 사직단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도성이 포위되면 서울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일은 아예 없을 터였다. 파주를 막아 낼 수 있다면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을 버려야 할 일이 없을 터이지만,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을 수 없는 까닭은 적들이 이미 임진강을 건넜기 때문이었다. 반드시 죽을 무기를 쥔 군사들은 반드시 죽을 싸움에 나아가 적의 말발굽 아래서 죽고, 신하는 임금의 몸을 막아서서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서서 아비는 아들을 죽인 적을 베고, 아들은 누이를 간음한 적을 찢어서 마침내 사직을 회복하리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 pp.18~19
눈 덮인 성벽에 햇빛이 내려서 성은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북쪽 능선을 넘어가는 성벽 위에 낮달이 떠 있었다. 간밤에 작은 교전이 있었는지 성벽에 돋아난 나뭇가지에 찢어진 시체가 몇 구 걸렸고, 시체 언저리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용골대가 통역 정명수에게 말했다.
-단단해 보인다. 산골나라에는 저런 성이 맞겠어.
-조선은 성 안이 허술합니다.
-허나 성벽은 날카롭구나. 깨뜨리기가 쉽지는 않겠어.
-바싹 조이면 깨뜨리지 않아도 안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 보느냐. 듣기에 좋다.
--- p.70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 p.143
조선 왕은 황색 일산 앞에 꿇어앉았다.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칸이 술 석 잔을 내렸다. 조선 왕은 한 잔에 세 번씩 다시 절했다. 세자가 따랐다. 개들이 황색 일산 안으로 들어왔다. 칸이 술상 위로 고기를 던졌다. 뛰어오른 개가 고기를 물고 일산 밖으로 나갔다.
-아, 잠깐 멈추라.
조선 왕이 절을 멈추었다. 칸이 휘장을 들추고 일산 밖으로 나갔다. 칸은 바지춤을 내리고 단 아래쪽으로 오줌을 갈겼다. 바람이 불어서 오줌 줄기가 길게 날렸다. 칸이 오줌을 털고 바지춤을 여미었다. 칸은 다시 일산 안으로 들어와 상 앞에 앉았다. 칸이 셋째 잔을 내렸다. 조선 왕은 남은 절을 계속했다. _ 356쪽
임금은 늘 표정이 없고 말을 아꼈다. 지밀상궁들조차 임금의 음색을 기억하지 못했고 임금의 심기를 헤아리지 못했다. 임금은 먹을 찍어서 시부詩賦를 적지 않았고 사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양사.司에 내리는 비답批答의 초안조차 승지들에게 받아쓰게 하여 묵적을 남기지 않았다.
--- p.10
임금은 취나물 국물을 조금씩 떠서 넘겼다. 국 건더기를 입에 넣고, 임금은 취나물 잎맥을 혀로 더듬었다. 흐린 김 속에서 서북과 남도의 산맥이며 강줄기가 떠올랐다. 민촌의 간장은 맑았다. 몸속이 가물었던지 국물은 순하고 깊게 퍼졌다. 국물에서 흙냄새가 났다. 봄볕에 부푼 흙냄새 같기도 했고 젖어서 무거운 흙냄새 같기도 했고 마른 여름날의 타는 흙냄새 같기도 했다. 임금은 국물에 밥을 말았다. 살진 밥알들이 입속에서 낱낱이 씹혔다. 임금은 혀로 밥알을 한 톨씩 더듬었다. …사직은 흙냄새 같은 것인가, 사직은 흙냄새만도 못한 것인가……. 콧구멍에 김이 서려 임금은 훌쩍거렸다.
--- pp.104~105
버티지 못하면 어찌 하겠느냐. 버티면 버티어지는 것이고, 버티지 않으면 버티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김상헌은 그 말을 아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삶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아침이 오고 또 봄이 오듯이 새로운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이 성 안에서 세상은 끝날 것이고 끝나는 날까지 고통을 다 바쳐야 할 것이지만, 아침은 오고 봄은 기어이 오는 것이어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왔듯 성 안에서 성 밖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찌 없다 하겠느냐…….
--- p.61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성 안에 들어와서 견디어 낸 날들에 비하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견딜 만하리라. 그 짧은 동안을 견디면, 무엇을 부술 수 있고 무엇을 부술 수 없는지 선명히 드러날 것이었다. 그 지난한 것들의 가벼움에 김상헌은 안도했다. 삼전도로 가는 임금의 발 아래 시체를 깔아 놓고 시체가 되어 임금을 전송해야만 세상의 길은 열릴 것이었는데, 임금의 출성이 임박했으므로 일을 서둘러야 했다. 김상헌은 마당에 서 있는 두 조카를 향해 말했다.
-때가 되었다. 나는 죽으니, 너희는 그리 알라. 너희는 방 밖에 정히 앉아서 나를 보내라.
--- p.342
…전하, 지금 성 안에는 말言먼지가 자욱하고 성 밖 또한 말馬먼지가 자욱하니 삶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 것이며, 이 성이 대체 돌로 쌓은 성이옵니까, 말로 쌓은 성이옵니까. 적에게 닿는 저 하얀 들길이 비록 가까우나 한없이 멀고, 성 밖에 오직 죽음이 있다 해도 삶의 길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뻗어 있고 그 반대는 아닐 것이며, 삶은 돌이킬 수 없고 죽음 또한 돌이킬 수 없을진대 저 먼 길을 다 건너가야 비로소 삶의 자리에 닿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길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어 재세在世하시옵소서. 세상에 머물러주시옵소서…….
--- pp.197~198
부리던 노복이 성첩으로 끌려간 뒤 최명길은 손수 걸레를 빨아서 방바닥과 툇마루를 닦았고, 문풍지로 바람구멍을 막았다. 최명길의 방 한 칸은 세간이 없어 됫박처럼 보였다. 지필묵이 놓인 서안 한 개와 횃대에 걸린 조복 한 벌이 전부였다. 한 칸 방은 정갈했고, 비어서 삼엄했다. (…) 최명길은 묘당의 당상들을 방으로 들이지 않았다. 저물어서 돌아오는 김상헌은 마당을 쓸거나 아궁이를 청소하는 최명길과 마주쳤다. 둘은 멀리서도 서로의 기척을 알아차리는 듯싶었다. 김상헌이 질청 문을 들어서면 인기척을 내지 않아도 최명길은 일손을 멈추고 김상헌을 맞았다. 이조판서와 예조판서는 질청 마당에서 서로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다.
--- p.212
최명길의 얼굴에 흐린 웃음기가 번졌다.
-그럼 내 머리를 들고 출성을 하면 어떻겠소?
-말씀이 너무 거칠구려. 지금 싸우자고 준열한 언동을 일삼는 자들도 내심 대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소. 충렬의 반열에 앉아서 역적이 성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소. 이 성은 대감을 집행할 힘이 아마도 없을 것이오.
_수어사는 어느 쪽이오?
이시백이 대답했다.
_나는 아무 쪽도 아니오. 나는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초병이오.
최명길의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조선에 그대 같은 자가 백 명만 있었던들……. - 목차
-
눈보라
언 강
푸른 연기
뱃사공
대장장이
겨울비
봉우리
말먹이 풀
초가지붕
계집아이
똥
바늘
머리 하나
웃으면서 곡하기
돌멩이
사다리
밴댕이젓
소문
길
말먼지
망월봉
돼지기름
격서
온조의 나라
쇠고기
붉은 눈
설날
냉이
물비늘
이 잡기
답서
문장가
역적
빛가루
홍이포
반란
출성
두 신하
흙냄새
성 안의 봄
하는 말
남한산성 지도
연대기
실록
낱말풀이

- 전체
- 문학
- aaa
- aaa
- aaa
- 일본소설
- 한국소설
- 영미소설
- 중국소설
- 기타언어소설
- 한국에세이
- 외국에세이
- 시
- 기타(평론/비평 등)
- 경제/경영 77
- 경제 17
- 경영 32
- 마케팅/세일즈 10
- 투자/재테크 11
- 기타(경제/경영) 7
- CEO/비즈니스맨
- 자기계발 105
- 성공/처세 70
- 능력계발 15
- 기타(자기계발) 20
- 인간관계
- 인문/역사/사회 101
- 인문 34
- 역사 26
- 인물 1
- 사회과학/정치 29
- 자연/과학 10
- 기타(인문/역사/인물) 1
- 기타 39
- 언어 1
- 가정/생활/요리 3
- 컴퓨터/인터넷 3
- 건강/취미/실용 5
- 만화
- 여행
- 예술/대중문화
- 정기간행물
- CD/DVD
- 육아/자녀교육 9
- 유아/아동/어린이 1
- 기타(기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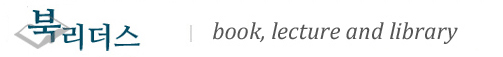




0 댓글